글
 |
비도시지역 인구는 1.4% 증가
저성장에 베이비부머 은퇴 영향
농촌 교통망·인프라도 좋아진 덕
억대 연봉자 작년보다 3.3% 늘어
50대가 절반, 축산 분야가 41%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은 22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횡성호로 흘러들어 가는 갑천변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농부 권중기(53)씨가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권씨는 이곳 유평 들판에서 비닐하우스 7개 동으로 친환경 무농약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 4월 초 육묘를 하고, 7월 말부터 시작하는 수확은 10월 초까지 계속된다. 이 때문에 고향이 안동인 권씨는 19일 추석 차례를 지내고 곧바로 횡성으로 돌아왔다. 수확철엔 하루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골농부 티가 풀풀 나는 권씨는 3년 전만 해도 서울 대기업의 부장이었다.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지만, 2010년 3월 돌연 퇴직과 함께 귀농을 선언했다.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도시민 귀농 창업과정'을 다니는 등 1년 가까이 귀농을 준비한 뒤 창업과정 동기들과 함께 2011년 1월 횡성에 정착했다. 어릴 적 살던 시골 고향의 삶도 그리웠지만 퇴직 이후의 생활도 걱정됐기 때문이다. 벌이는 대기업 부장 시절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권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한다. 권씨는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농촌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같이 귀농 교육을 받은 동기들과 서로 격려하며 잘 지내고 있다”며 웃었다.
권씨처럼 대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면서 지방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로 돌아가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의하는 '귀농(歸農)'이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나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歸村)'은 '농촌으로 이주는 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전원생활을 하거나 농업 외에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상으로 동(洞)을 떠나 읍·면으로 이사하면 귀촌의 통계로 잡힌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귀농·귀촌 가구는 2009년 4000가구를 돌파하더니 불과 3년 만인 지난해에는 2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 말 한국 사회의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전년(91.12%) 대비 0.08%포인트 줄어든 91.04%로 조사됐다.
물론 한국 사회의 인구가 아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대신 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친 반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비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4%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 39.1%였으나 2000년 88.3%까지 급증했다. 이후 2005년(90.1%)부터 7년간 1%포인트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추세가 둔화돼 왔다. 국토부 통계의 '도시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이 아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등 4개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시(市)'라도 도시지역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도시지역 인구비율 첫 감소 통계'는 농림부의 '귀농·귀촌 트렌드'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귀농·귀촌과 탈(脫) 도시의 바람은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던 60, 70년대에 도시의 일자리를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의 바람이 불었다면, 2000년대 이후엔 저성장과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에 '베이비 부머'(1955~63년생 715만 명)의 은퇴시기까지 겹치면서 귀농·귀촌을 중심으로 한 탈(脫) 도시화의 현상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 수석연구원은 “은퇴자들이 살기에 서울 등 대도시는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환경도 좋지 않다”며 “최근 들어 도시와 농촌 간 교통망이 잘 구축되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면서 대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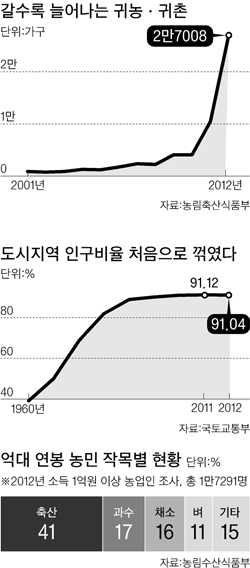 |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이점을 돈으로 환산했다. 2008년 기준 도시민 한 사람이 귀농·귀촌할 경우 지역총생산의 사회적 순증가가 109만원, 교통혼잡비용의 도시지역 감소분이 59만원, 하수처리비용의 사회적 순편익이 6000원,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사회적 순편익이 2만4000원이라고 계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경덕 책임연구위원은 “도시민 중에서도 40~50대 및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농어촌 이주는 더 많은 지역총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농촌에서 일하면 도시보다 소득이 떨어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올 1월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농업경영체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억원 이상의 연소득을 벌어들이는 농업인은 1만6401명이며, 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법인도 890개에 달했다. 이는 2011년(농업인 1만5959명, 법인 763곳)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4년 전(2009년)만 하더라도 억대 농업인은 1만3994명, 법인체는 618곳 정도였다. 억대 농부는 지역적으로는 경북(37%)에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축산분야(41%)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는 50대가 절반(50%)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안종락 사무관은 “최근 들어 농가당 농사 규모가 커지고, 시설이 현대화하면서 소득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며 “농촌이라도 농사에만 그치지 않고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거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가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