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른바 ‘버스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단말기들 대부분이 이처럼 대리점들이 엄청난 손실을 떠안기 때문에 가능하다. ‘버스폰’은 버스요금만큼 저렴하다는 의미와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타야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신조어다.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리점주의 손해가 늘어난다. 3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은 “포화시장에 이른 시장에서 한 명이라도 가입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마진 없이 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역마진이 발생하는 출혈경쟁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통신사 대리점끼리는 물론이고, 같은 통신사 대리점들끼리도 발생한다.
 |
||
| ▲ 서울 용산에 입점해 있는 통신사 대리점들 모습. | ||
통신사들이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1차 보조금이다. 정책은 회사 목표와 통신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가령 갤럭시S4를 주력상품으로 정했다면 다른 기기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특정 통신사의 영업정지 기간이면 경쟁사들은 평소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영업정지를 당한 통신사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다.
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판매점을 확보하는 게 경쟁의 관건이 된다. 대리점들끼리도 보조금 경쟁을 벌여야 한다. 대리점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2차 보조금이다. KT 대리점을 운영하는 안아무개씨는 “본사에서 정해주는 보조금이 30만원 이라면 여기에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을 ‘펀딩’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이동통신 본사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30만원에 대리점 펀딩을 더해 40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KT 대리점을 운영했던 박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은 모든 대리점들이 노리는 곳”이라면서 “그러려면 단가가 좋아야하는데, 단가가 좋다는 건 펀딩을 많이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리점은 보통 고객의 이동통신 요금에서 5~7%의 수수료를 받는다. 통신요금이 월 5만원이라면 2년 약정 기준으로 6만~9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게 되는 셈이다.
KT 대리점주 안씨는 “시장에 이미 다 펀딩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추가 펀딩을 안 하면 판매점을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펀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리점주들은 “기본적으로 5만원은 펀딩을 한다”면서 “웬만한 대리점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통신사들도 현장에서 이런 과열 경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대리점주들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씨는 “우리가 5만원을 펀딩하는데 만약에 옆 대리점이 6만원을 펀딩한다면 본사 관리자가 우리도 6만원으로 펀딩을 올리라고 한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해온 김아무개씨도 본사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 김씨는 “본사에서 4만~5만원씩 ‘실어주라고’ 압박을 가한다”면서 “5만원 이상 실어주면 골병든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펀딩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실제로 나도 중간에 몇 억 털어먹고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벌점 제도까지 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판매 실적이 부족하면 본사에 ‘차감’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내야한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10만원짜리 핸드폰을 5만원에 팔라는 정책이 내려오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게 되는데 안 팔면 1대에 20만원씩 차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씨 말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5만원 손해와 20만원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본사는 목표를 계속 올린다”면서 “실적을 못 내면 차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뽐뿌 같은 곳에서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게 이른바 ‘버스폰’이 된다는 이야기다. 2009년 LG유플러스 대리점을 폐점한 허아무개씨 역시 “대리점은 다 손해지만 본사는 고객을 다 건졌다”면서 “대리점은 언젠가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삼성 이건희가 와도 LG유플러스는 못 당한다”고 말했다.
 |
||
| ▲ kt피해 대리점주들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흑석동 kt 대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늬 기자 hanee@ | ||
KT 관계자도 1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리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냐”면서 “나중에 대리점이 벌어들을 수익을 예상해서 고객에게 미리 혜택을 주는 것이지 손해는 아닐 것,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KT에서 펀딩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이 팔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많이 팔면 인센티비를 따로 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시장이 이미 포화가 된 상태여서 무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K 텔레콤 역시 "대리점쪽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이 한 명 가입시키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단말기를 적게 팔고 한번에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있고. 단말기를 싸게 팔더라도 여러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대리점이 있다"라면서 "본사에서 이를 권유하거나 (펀딩을) 안 한다고 해서 차감을 한다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역사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단말기 부품 수입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 일몰을 연장하면서 살아남다가 2008년 3월에서야 폐지됐지만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강자선씨는 “제조사가 유통을 하고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통신사만 다 하는 구조”라면서 “잘못된 유통구조 때문에 대리점들은 잘 팔고도 뒤로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도 “다른 전자제품은 기기를 사고 나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건지 결정하는데 휴대폰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이통사와 핸드폰을 한번에 결정해야하는 구조에서는 대리점들은 보조금 출혈경쟁을 하고,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만큼 통신비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윤철한 경실련 팀장은 “보조금 규제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점들의 불법 보조금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를 고민을 해야하고 이통사만 배불리는 규제라면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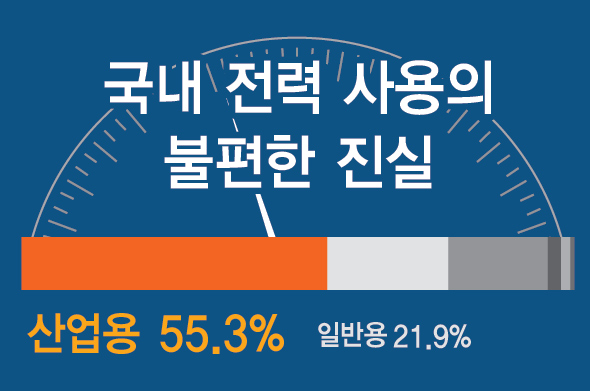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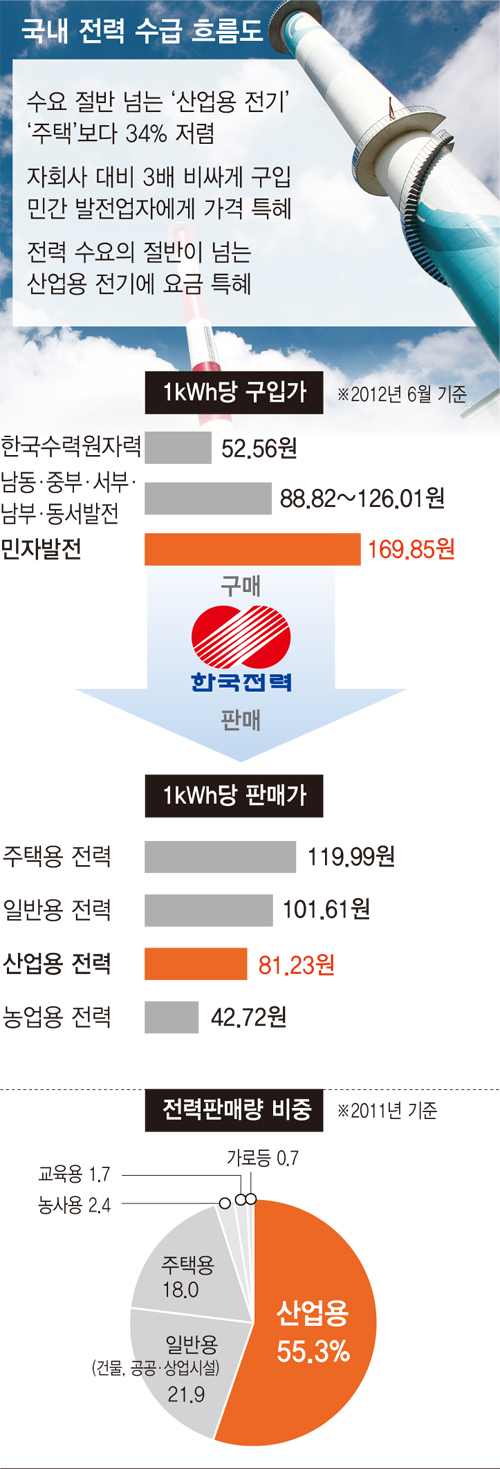










RECENT COMMENT